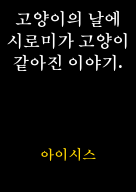본 팬픽은 青白님의 허가를 받았음을 알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월 22일. 일본인들이 고양이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 그것은 일어났다. 더욱이 그 때 우리들은 2학년으로, 2라는 숫자가 잔뜩 있는 것이니, 혹시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무슨 필연인가,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지만.
「무거워…… 귀찮아……」
「잠깐 시로, 쉬지마. 빨리 이것 옮기지 않으면 부실 못 가니까」
방과후. 부실로 향하고 있던 나와 시로는 복도에서 교재를 옮기고 있던 선생님에게 딱 걸려서, 창고로 옮기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제 무리, 못 걸어」
「거기, 아직 복도의 반도 걷지 않았잖아. 앞으로 조금이니까, 분발해」
그러는 사이에 창고에 간신히 도착했다.
「우와아……」
문을 열자, 나는 무심코 그런 소리를 내버렸다. 창고에 있는 선반이란 선반은, 모두 어지러져 있었다. 청소한 적이 있기나 한 것인지, 먼지가 자욱했다.
「그냥 두고 가 버릴까, 이거……」
「그럼 안 돼지, 적당히 해」
시로가 창고 안에 들어가, 선반 위에 빈 공간을 찾았다. 그리고 딱 좋은 장소가 있었는지, 짐을 그곳에 두었다. 그것이 좋지 않았다.
충격으로 선반이 흔들려, 위에 있던 물건이 차례차례로 시로를 향해 떨어졌던 것이다.
「시로!」
흩날리는 먼지를 뿌리치며 시로에게 돌려간다. 떨어져 내린 물건이 흩어진 바닥 위에, 그녀는 넘어져 있었다.
「시로, 괜찮아?」
당황해 하면서, 그녀를 일으킨다. 어쩌면 뇌진탕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녀는 곧바로 눈을 떴다.
「아파……」
「깨어난 거야? 어지럽지 않아?」
「괜찮아. 혹이 생긴 것 뿐」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안심이 되자 자연스레 한숨이 나왔다. 아무래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로는 별로 괜찮지 않았던 것이다.
일단 말하자면, 나는 당황하는 중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모르지만, 우선은 상황을 정리해보자.
창고를 나온 나와 시로는,, 부실에 갔다. 쿠루미는 아직 오지 않은 거 같아, 기다리기로 하고 일단 앉았다.
그러자, 어째서인지 시로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소파에 누웠다.
아무런 예고도 없는 갑작스러운 행동. 당황하는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듯이 그녀는 몸을 말아 진심으로 휴식이라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시로 본인에게 물어 보기로 했다.
「저기, 시로?」
「응―, 왜?」
「무, 뭐 하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자고 있어」
그런 건 알아! 문제는 장소라고!
소리 지를 뻔한 것을 참고, 심호흡. 침착하게 시로를 보면, 몸을 만 포즈가 어쩐지 고양이 같은 것을 알아 챘다. 뻔뻔스러운 점이,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고양이와 딱 닮았다.
나도 모르게, 살짝 시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본다.
「응―……」
그러자 시로가, 목을 울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이번에는 턱을 손가락 끝으로 살살 쓰다듬어 본다. 조금 전보다 더 목을 울리는 듯한 목소리. 완전히 고양이다.
「시로, 여기 봐」
시험 삼아 조금 떨어진 곳에 왼손 집게 손가락을 위 아래로 움직여 보았다.
「……」
그것을 보자마자, 시로는 둥글게 만 손으로 장난치기 시작한다. 어떻게 생각해도, 고양이다.
일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린다. 아니, 지금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피가 요동쳤기 때문으로 결코 시로에게 두근거린 것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마음 속으로 이상한 변명을 해 버린다. 에잇, 진정해 나.
그보다 아까부터 시로는 어쩐지 이상하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어째서 돌연 이렇게 고양이화가 된 것일까.
「아」
짐작 가는 것이 있다. 조금 전 창고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로는 선반에서 떨어진 것에 머리를 부딪친 것 같았다. 어쩌면 그것이 원인일까., 그것 외에는 잘 모르겠고…….
「저기 말이야, 시로……」
입을 열려고 한 순간, 갑자기 시로에게 왼손이 잡혔다. 그대로, 집게 손가락을 시로가 입으로 살며시 물었다.
「잠깐, 시로 무슨……!」
「……어쩐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대로 가볍게 깨물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이, 이것은 과연 좋지 않아.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어째서 인지 나는 손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시, 시로…… 그만….」
말을 마치기돋 전에, 손가락 끝을 쪽 가볍게 소리를 내며 넣는다. 이상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다.
「네, 네!는 이, 이제 끝! 끝이야!」
당황해서 시로에게서 손을 떼어 놓는다. 이 이상 계속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안돼……?」
시로가 아쉬운 듯이 눈을 치켜 뜨면서 나를 본다. 심장 소리가 강하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피가 요동친다 운운 같은 것이 아닌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진다. 견딜 수 없어 나는 시로에게서 시선을 돌린다.
도대체 이 분위기는 무엇일까. 쿠루미, 부탁이니까 빨리 와줘. 아직 오지 않는 쿠루미에게 텔레파시로 도움을 요청한다. 물론 대답은 없다.
문득, 시로가 몸을 일으켜 내 곁에 앉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순간 나는 소파에 밀어 넘어뜨려져 있었다. 시로의 몸이, 내 몸에 포개진다.
이미 무엇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걸까.
깨달으면 시로의 얼굴이 바로 눈 앞에 있었다. 엣, 거짓말. 이 흐름은 혹시 키스……? 아니, 어째서?
심장이 몸에서 뛰쳐나갈 것처럼 뛰고 있다. 이미 눈에는 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드디어 시로의 입술이 닿을 거 같아 눈을 감으려는데, 그 조준이 빗나갔다.
뺨에 부드러운 감촉. 아마, 시로의 입술이다. 안심이 되면서도 아쉬운 기분이 든 순간, 다음은 조금 끈적하고 미지근한 것이 느껴졌다. 어떻게 생각해도, 혀였다.
「히익, 시로!?」
놀라는 나의 뺨을, 시로는 더욱 핥는다.
「사에……」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며 나내이름을 부른다. 그것으로 나를 제어하고 있던 브레이크가 단번에 망가진 것 같았다.
「시, 시로…… 있잖아, 나……」
지금까지 쌓아 온 연심. 이제 전부 털어 놓자. 나는 거의 자포자기였다.
「시로를……, 조… 조…」
「미안, 늦었어! 담임에게 잡혀 버려서」
그 때, 부실 문이 열ㄹ고 쿠루미가 나타났다. 그녀는 몹시 놀란다.
「어라, 어째서 시로가 바닥에서 자고 있어?」
「그, 글쎄……」
미닫이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순간, 나는 경이적인 반사 신경으로 순식간에 시로를 냅다 밀쳤다. 시로는 소파에서 내던져져, 그대로 바닥으로 다이빙. 그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여보세요~ , 시로? 일어났어?」
위를 향해 누워있는 시로를 , 쿠루미가 친다. 그녀는 곧바로 눈을 열었다.
「아얏…… 머리 아파.」
「이런 곳에서 자니까 그렇지. 자, 일어나!」
「어라, 나 어째서 여기에?」
주위를 둘러보고, 시로가 그렇게 말했다.
이것은 혹시. 안 좋은 예감이 든다.
「……시로, 조금 전의 일 기억나지 않아?」
「에? 창고에 간 건 기억이 나는데……어느새 부실에?」
「무슨 말하는 거야 시로? 너무 자서 머리가 이상해 진 거지?」
쿠루미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아무래도, 창고에서 머리를 부딪치고 난 이후의 기억이 없어져 버린 것 같다. 바닥으로 날아갔을 때, 또 머리를 부딪친 것 같다.
「뭐야 그건……」
그 자리에 주저 앉아 버린 나. 그럼 조금 전의는, 도대체 무엇 이었을까. 터무니 없다.
지금 눈앞에 있는 시로는, 틀림없이 평소의 시로다. 뭐, 돌아온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나의 일생 일대 고백도, 없었던 것이 되어 버린 것일까. 아까 전 자신이 바보 같아, 실소할 것 같았다.
「어라, 하지만 조금 전 사에와……」
그렇게 말하고 이쪽을 향한 시로의 얼굴이, 갑자기 새빨갛게 되었다.
「엣, 시로, 어째……」
물으려다가, 눈치챘다. 그리고, 시로처럼 내 얼굴도 붉어진다.
방금 전의 일, 반드시 시로는 기억이 난 것이다. 그럼 혹시, 내가 이야기를 한 것도……?
「뭐야, 두 사람 모두 감기?」
붉어진 우리들 사이에서, 쿠루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
안녕하세요. 아이시스입니다.
青白님은 저번에 번역한 아치가 이야기를 포함해 사키에 대해 많은 단편을 썼습니다.
일부는 이 게시판에 올릴 수 없지만요 -_-;;; 선정하는 데 나름 애를 먹기는 했지만 정했기에... 가급적 오늘 내로 다 올릴 생각입니다.
(134)
2월 22일. 일본인들이 고양이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 그것은 일어났다. 더욱이 그 때 우리들은 2학년으로, 2라는 숫자가 잔뜩 있는 것이니, 혹시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무슨 필연인가,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지만.
「무거워…… 귀찮아……」
「잠깐 시로, 쉬지마. 빨리 이것 옮기지 않으면 부실 못 가니까」
방과후. 부실로 향하고 있던 나와 시로는 복도에서 교재를 옮기고 있던 선생님에게 딱 걸려서, 창고로 옮기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제 무리, 못 걸어」
「거기, 아직 복도의 반도 걷지 않았잖아. 앞으로 조금이니까, 분발해」
그러는 사이에 창고에 간신히 도착했다.
「우와아……」
문을 열자, 나는 무심코 그런 소리를 내버렸다. 창고에 있는 선반이란 선반은, 모두 어지러져 있었다. 청소한 적이 있기나 한 것인지, 먼지가 자욱했다.
「그냥 두고 가 버릴까, 이거……」
「그럼 안 돼지, 적당히 해」
시로가 창고 안에 들어가, 선반 위에 빈 공간을 찾았다. 그리고 딱 좋은 장소가 있었는지, 짐을 그곳에 두었다. 그것이 좋지 않았다.
충격으로 선반이 흔들려, 위에 있던 물건이 차례차례로 시로를 향해 떨어졌던 것이다.
「시로!」
흩날리는 먼지를 뿌리치며 시로에게 돌려간다. 떨어져 내린 물건이 흩어진 바닥 위에, 그녀는 넘어져 있었다.
「시로, 괜찮아?」
당황해 하면서, 그녀를 일으킨다. 어쩌면 뇌진탕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녀는 곧바로 눈을 떴다.
「아파……」
「깨어난 거야? 어지럽지 않아?」
「괜찮아. 혹이 생긴 것 뿐」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안심이 되자 자연스레 한숨이 나왔다. 아무래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시로는 별로 괜찮지 않았던 것이다.
일단 말하자면, 나는 당황하는 중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모르지만, 우선은 상황을 정리해보자.
창고를 나온 나와 시로는,, 부실에 갔다. 쿠루미는 아직 오지 않은 거 같아, 기다리기로 하고 일단 앉았다.
그러자, 어째서인지 시로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소파에 누웠다.
아무런 예고도 없는 갑작스러운 행동. 당황하는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듯이 그녀는 몸을 말아 진심으로 휴식이라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시로 본인에게 물어 보기로 했다.
「저기, 시로?」
「응―, 왜?」
「무, 뭐 하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자고 있어」
그런 건 알아! 문제는 장소라고!
소리 지를 뻔한 것을 참고, 심호흡. 침착하게 시로를 보면, 몸을 만 포즈가 어쩐지 고양이 같은 것을 알아 챘다. 뻔뻔스러운 점이,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고양이와 딱 닮았다.
나도 모르게, 살짝 시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본다.
「응―……」
그러자 시로가, 목을 울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이번에는 턱을 손가락 끝으로 살살 쓰다듬어 본다. 조금 전보다 더 목을 울리는 듯한 목소리. 완전히 고양이다.
「시로, 여기 봐」
시험 삼아 조금 떨어진 곳에 왼손 집게 손가락을 위 아래로 움직여 보았다.
「……」
그것을 보자마자, 시로는 둥글게 만 손으로 장난치기 시작한다. 어떻게 생각해도, 고양이다.
일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떨린다. 아니, 지금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피가 요동쳤기 때문으로 결코 시로에게 두근거린 것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마음 속으로 이상한 변명을 해 버린다. 에잇, 진정해 나.
그보다 아까부터 시로는 어쩐지 이상하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어째서 돌연 이렇게 고양이화가 된 것일까.
「아」
짐작 가는 것이 있다. 조금 전 창고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로는 선반에서 떨어진 것에 머리를 부딪친 것 같았다. 어쩌면 그것이 원인일까., 그것 외에는 잘 모르겠고…….
「저기 말이야, 시로……」
입을 열려고 한 순간, 갑자기 시로에게 왼손이 잡혔다. 그대로, 집게 손가락을 시로가 입으로 살며시 물었다.
「잠깐, 시로 무슨……!」
「……어쩐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대로 가볍게 깨물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이, 이것은 과연 좋지 않아.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어째서 인지 나는 손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시, 시로…… 그만….」
말을 마치기돋 전에, 손가락 끝을 쪽 가볍게 소리를 내며 넣는다. 이상한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다.
「네, 네!는 이, 이제 끝! 끝이야!」
당황해서 시로에게서 손을 떼어 놓는다. 이 이상 계속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안돼……?」
시로가 아쉬운 듯이 눈을 치켜 뜨면서 나를 본다. 심장 소리가 강하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피가 요동친다 운운 같은 것이 아닌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진다. 견딜 수 없어 나는 시로에게서 시선을 돌린다.
도대체 이 분위기는 무엇일까. 쿠루미, 부탁이니까 빨리 와줘. 아직 오지 않는 쿠루미에게 텔레파시로 도움을 요청한다. 물론 대답은 없다.
문득, 시로가 몸을 일으켜 내 곁에 앉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순간 나는 소파에 밀어 넘어뜨려져 있었다. 시로의 몸이, 내 몸에 포개진다.
이미 무엇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걸까.
깨달으면 시로의 얼굴이 바로 눈 앞에 있었다. 엣, 거짓말. 이 흐름은 혹시 키스……? 아니, 어째서?
심장이 몸에서 뛰쳐나갈 것처럼 뛰고 있다. 이미 눈에는 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드디어 시로의 입술이 닿을 거 같아 눈을 감으려는데, 그 조준이 빗나갔다.
뺨에 부드러운 감촉. 아마, 시로의 입술이다. 안심이 되면서도 아쉬운 기분이 든 순간, 다음은 조금 끈적하고 미지근한 것이 느껴졌다. 어떻게 생각해도, 혀였다.
「히익, 시로!?」
놀라는 나의 뺨을, 시로는 더욱 핥는다.
「사에……」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며 나내이름을 부른다. 그것으로 나를 제어하고 있던 브레이크가 단번에 망가진 것 같았다.
「시, 시로…… 있잖아, 나……」
지금까지 쌓아 온 연심. 이제 전부 털어 놓자. 나는 거의 자포자기였다.
「시로를……, 조… 조…」
「미안, 늦었어! 담임에게 잡혀 버려서」
그 때, 부실 문이 열ㄹ고 쿠루미가 나타났다. 그녀는 몹시 놀란다.
「어라, 어째서 시로가 바닥에서 자고 있어?」
「그, 글쎄……」
미닫이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순간, 나는 경이적인 반사 신경으로 순식간에 시로를 냅다 밀쳤다. 시로는 소파에서 내던져져, 그대로 바닥으로 다이빙. 그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여보세요~ , 시로? 일어났어?」
위를 향해 누워있는 시로를 , 쿠루미가 친다. 그녀는 곧바로 눈을 열었다.
「아얏…… 머리 아파.」
「이런 곳에서 자니까 그렇지. 자, 일어나!」
「어라, 나 어째서 여기에?」
주위를 둘러보고, 시로가 그렇게 말했다.
이것은 혹시. 안 좋은 예감이 든다.
「……시로, 조금 전의 일 기억나지 않아?」
「에? 창고에 간 건 기억이 나는데……어느새 부실에?」
「무슨 말하는 거야 시로? 너무 자서 머리가 이상해 진 거지?」
쿠루미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아무래도, 창고에서 머리를 부딪치고 난 이후의 기억이 없어져 버린 것 같다. 바닥으로 날아갔을 때, 또 머리를 부딪친 것 같다.
「뭐야 그건……」
그 자리에 주저 앉아 버린 나. 그럼 조금 전의는, 도대체 무엇 이었을까. 터무니 없다.
지금 눈앞에 있는 시로는, 틀림없이 평소의 시로다. 뭐, 돌아온 것은 좋은 것이지만.
나의 일생 일대 고백도, 없었던 것이 되어 버린 것일까. 아까 전 자신이 바보 같아, 실소할 것 같았다.
「어라, 하지만 조금 전 사에와……」
그렇게 말하고 이쪽을 향한 시로의 얼굴이, 갑자기 새빨갛게 되었다.
「엣, 시로, 어째……」
물으려다가, 눈치챘다. 그리고, 시로처럼 내 얼굴도 붉어진다.
방금 전의 일, 반드시 시로는 기억이 난 것이다. 그럼 혹시, 내가 이야기를 한 것도……?
「뭐야, 두 사람 모두 감기?」
붉어진 우리들 사이에서, 쿠루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
안녕하세요. 아이시스입니다.
青白님은 저번에 번역한 아치가 이야기를 포함해 사키에 대해 많은 단편을 썼습니다.
일부는 이 게시판에 올릴 수 없지만요 -_-;;; 선정하는 데 나름 애를 먹기는 했지만 정했기에... 가급적 오늘 내로 다 올릴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