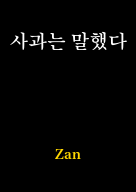(38) 사과는 당연히 말을 못 합니다.
노곤하다. 겨울이지만 따뜻한 우리 집은 보일러라는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다. 따뜻하다. 침대에서 수 분간 멍하게 잠을 되새김질하다가 거실로 나왔다.
조용한 집 분위기를 보아하니 어머니는 출근하신 것 같다. 직장인은 참 바쁘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정수기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신다. 상쾌한 청량감이 목을 감돌자 그제야 제법 정신이 든다. 아침 식사 용도로 사과를 꺼내 씻었다. 크게 한 입 베어 물며 푹신한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에서 한창 최근에 일어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알려대고 있었다. 살인, 사건, 사고, 불황, 실직 등등등. 멍하게 TV를 보고 있자니 식탁에 놓여 있던 사과가 말한다. "세상 참 말세네."
나는 잠시 멍해 있다가 말한다. "그러게."
침묵이 이어진다. 나는 묻는다.
"최근에 용산참사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넌 그런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니?"
사과는 불그죽죽한 면상을 갸우뚱거리다가 말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제법 평범한 면상을 갸우뚱거리다가 말한다. "아무 생각 안 든다고 생각하는데."
사과는 깜짝 놀란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말한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무표정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말한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는 저놈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착한 어린이식 국어책 읽는 듯한 말투를 뜯어고쳐야겠다고 생각한다. 어느 틈에 나도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 젠장.
나는 말했다. "착한 척은 안 해. 솔직히 별 감정 없다고."
사과는 잠시 한숨을 쉬다가, '너 같은 녀석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썩는 거다'라고 말하는 듯한 근엄한 학년부장 선생님의 표정을 짓고는, 잠시 생각하다가, 몸을 크게 움츠리고는, 크게 도약해서 나의 배를 강타했다.
나는 강타당한 복부를 문지르며 말했다. "아야."
사과는 말했다. "아프냐."
나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당연히 아프지. 근데 여기서 '나도 아프다'라든가 그런 개그 하면 갈겨버린다."
사과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아프당게."
나는 묵묵히 사과에게 귀싸대기를 날렸다. 사과는 아픈 뺨을 부여잡고 말했다. "때리니까 아프다."
"당연히 맞으면 아프지"라고 나는 대꾸한다.
사과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럼 다른 사람도 맞으면 아프겠네."
나는 무표정하게 대꾸했다. "그렇겠지."
"저기 뉴스에 나오는 놈들도 아프겠네."
"그렇겠지."
"왜 관심이 없어"라고 사과는 말한다. "관련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냐."
"나만 그런 건 아냐." 나는 말한다.
"하긴"라고 사과는 덧붙였다. "니 괴로울 때도 세상은 아무 상관 없이 돌아갔지."
나는 말했다. "아버지 집 나갔을 때도 그랬고, 왕따 당했을 때도. 그리고 어제 어머니가 술 마시고 울 때도."
또다시 침묵. 뉴스에서 지껄여대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다. 나는 TV를 껐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무뚝뚝하게 사과가 말했다. "피해망상증."
"칭찬 고마워." 나는 대답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공기는 멈춰있었다. 기분이 나빠 창문을 열었다. 하늘은 새파랗고 공기는 건조했다. 사과는 말했다. "왜 울고 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피곤했다. 눈을 감았다. 사과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는 사과를 손에 집었다. 사과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한 입 아삭, 하고 베어 물었다. 맛있었다. 계속 먹었다. 사과는 어느새 꼭지만 남았다. 주저없이 한입에 삼켜버렸다. 그리고 잠시 멍해 있었다.
"피곤해서 그래." 나는 중얼거렸다. "이것저것 신경 쓰기엔 너무 피곤하니까."
대답은 없었다. 나는 조금 기분이 나빠졌다. 베란다로 나갔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다. 숨이 턱턱 막힐 듯한 건조한 공기는 천천히 목을 태웠다. 밑을 내려다보니 공터에는 아무도 없다. 주위는 그저 침묵에 뒤덮여 있었다. 누군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 없을 이 침묵.
나는 조금 슬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