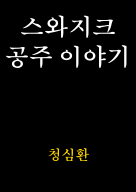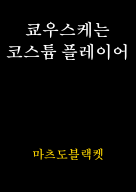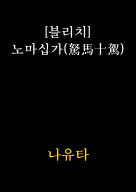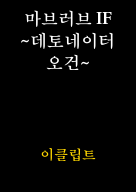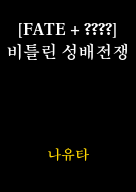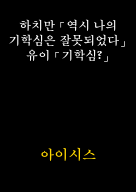무르익는 인연 7화 사소한 비밀들(5-3)
찜통의 꼭지를 틀어 압력을 빼자 '치익-' 하는 김 빠지는 소리와 함께 수증기가 솟구쳤다. 수증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뚜껑을 열자 잘 익은 밤들이 고소한 향기를 풍긴다. 마리사가 소개해준 캇파, 니토리 씨에게 특별히 주문제작한 찜통인데 성능이 정말 좋다. 씻기가 좀 번거로운 게 흠이지만 찌는 속도도 빠르고 속까지 빠짐없이 쪄내서 부드럽다. ...그러고 보면 마리사는 정말 발이 넓구나.
나무 집게로 잘 익은 밤톨들을 집어 접시에 담았다. 찌는 김에 넣어둔 감자 두 알과 함께 담자 접시가 소복하다. 유채꿀은 종지에 담아 곁들이고 마지막으로 포크 두 개를 얹어 식탁으로 내가자, 마리사가 군침을 삼키면서 손을 뻗었다.
"천천히 좀 먹어"
"이게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거라구"
찐 밤에 꿀을 듬뿍 찍어(아니, 밤을 꿀에 빠트려) 낼름 삼키고는 행복한 표정으로 우물거리는 마리사를 빤히 바라보며, 나도 포크로 하나 찍어 베어물었다. 텁텁하지 않으면서도 무르지도 않은 게 먹기 딱 좋다. 말캉말캉한 햇밤의 속살을 혀 위에서 부드럽게 으깨자 감겨드는 달콤하고 고소한 찰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짓게 한다.
"밤 맛있네. 어디서 딴 거야?
"이것도 케이네 씨가 준 거야"
"음~그 녀석, 하여간 제자 복은 많아가지고는. 나도 애들 모아놓고 마법 수업이나 해볼까?"
"네가 가르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걸? 수업이라기보다 자습이겠네"
"헹. 어차피 결국 중요한 건 자기 노력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덜 사나운 기세로 밤을 찍어먹는 그녀의 페이스엔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히 감자 하나를 포크로 잘랐다. 유채꿀을 살짝 찍어 깨물자 잘 쪄진 감자의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가득히 퍼진다. 입 안에서 천천히 감자를 으깨며 한 조각 더 베어내자 뭐가 또 불만인지 마리사가 툴툴거리며 참견해 왔다.
"무슨 감자를 포크로 잘라 먹냐? 감자는 이렇게 들고 먹는 게 제맛이라구"
"손에 묻혀가면서 먹기 싫을 뿐이야"
"어차피 너도 먹고 나서 손 씻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깔끔떠시긴"
"감자 범벅이 되는 것보단 깔끔떠는 게 나아"
"그건 불쌍하게도 평생 진짜 감자 맛을 모르고 사는 거라구"
마리사는 으스대며 감자를 한 입 가득 깨물었다. 자랑이랄 것도 없는 장난이지만 고작 감자 가지고 대단한 비밀이라도 아는 양 우쭐거리는 게 조금 심통이 나서 고집을 피우고 말았다.
"어차피 어떤 게 진짜인지는 내가 해석하기에 달린 거야"
"우후후, 감자 때문에 삐졌어? 감자 하나에 너무 열내지 말라구"
"웃기지 마"
단번에 속마음을 들켜버리자 부끄러움인지 옹졸함인지 기분이 싸해져서 죄없는 밤톨만 굴리고 있으니, 마리사가 그런 것엔 아랑곳하지 않고 수다를 걸어오기에 애써 털어버리고 답했다.
"하지만 넘겨짚기엔 아까운 말인데?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사실 못 알아들었지?"
"아아~니. 그럴 리가 있냐구. 하지만 앨리스 생각도 궁금할 뿐이야"
"...원래 모든 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니까, 진짜를 알고 싶으면 다스려야 하는 건 관측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인 자신이란 소리야"
"으음, 그래. 그런 뜻으로 말한 줄 알고 있었어"
"...."
"흥, 어쨌든 그런 건 재미없어. 이왕 할 거라면 치열하게 들이대서 진짜에 직접 부딪히고 싶다구"
어느새 집어올린 감자를 게눈 감추듯 먹어치운 마리사는 밤을 포크로 푹 찍더니 눈 앞에 들어올렸다. 자신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황갈색 눈동자에 가득히 들끓는 탐구욕이 빛나는 것만 같다. 지금은 눈 앞의 밤톨 정도나 바라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몰아치는 열기에도 개의치 않고 태양을 바라보겠지. 그 때는 언제쯤일까? ...그리고, 나는 그 때 과연 무얼 하고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는 사이에 네 감자는 사라진다는 거야"
"...많이 먹어. 난 그리 배고프진 않으니까"
마리사는 내 몫의 감자를 반이나 쪼개서는 한 입에 밀어넣고 우물거렸다. 뒤가 불보듯 빤히 보여 마리사의 컵에 우유단지를 기울였다.
"후, 후아, 뜨거! 무..물!"
아니나 다를까, 용케 참는다 싶더니 결국 손사래를 치며 허둥지둥 컵을 찾는다. 마리사에게 우유가 찰랑거리는 컵을 건네주자 물에 빠진 사람이 동앗줄이라도 만난 듯 허겁지겁 받아들고는 벌컥벌컥 들이켰다.
"..살았다"
간신히 뜨거운 감자를 삼킨 그녀는 혀를 내밀고 숨을 후-후- 내쉬며 손사레를 쳤다. 혹시나 걱정했는데 데이지는 않은 것 같아 다행이다. 이제 좀 얌전해지려나 싶었지만, 누가 마리사 아니랄까봐 방금 전의 일은 잊었다는 듯이 다시금 열심히 밤을 입 안으로 우겨넣는 걸 보니 입가에 저절로 쓴웃음이 걸린다.
"여, 그럼 잘 먹고간다구"
한동안 바쁘게 포크를 놀린 그녀는 기어이 접시를 다 비우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지 연신 배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에 한숨을 쉬자,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씩 웃는다. 얼굴에서 만족감을 잔뜩 흘리며 빗자루에 둔하게 올라타는 꼴을 보고 있자니 핀잔 한 마디를 던져주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
"칠칠맞기는. 제대로 날아갈 수나 있겠어?"
"크흐음, 문제 없...을 거라구. 그보다 '그건' 언제 시작할 생각이야? 쇠뿔도 단김에 빼는 게 낫다구?"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여기서 봐"
"오호~ 아침밥 기대하고 있으라는 거지? 얼마든지!"
"아니, 식사는 알아서..."
마리사의 터무니없는 억지를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는 대답할 새도 없이 떨어진 잎새들을 성대하게 휘날리며 쌩하니 하늘 저편으로 날아가 버렸다.
...정말 우울하게도, 그 탓에 흩날린 풀잎들을 옷에서 털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일 아침 식단을 고민하는 나는- 그녀 못지않게 칠칠맞은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