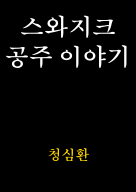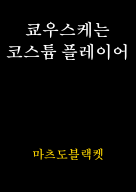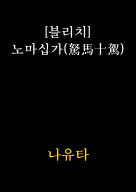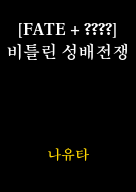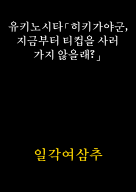눈물과 한탄(4)
나는 계단을 올라온 뒤 주위를 살폈다.
동굴이 이었다.
아마도 올라오기 전부터 빛이 점점 주는 것 같던데
주변에 자연동굴을 연결시킨 것이겠지
나는 자그마한 빛이 인도하는 반향으로 나아갔다.
어두운 동굴에서 나온 태양이 비추는 저녁놀을 보았다.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나는 앞으로 나아가며 생각했다.
여기는 대체 어딜까?
수풀이 우거진 울창한 밀림이라도 될 듯한 숲에서
출구 없는 미로에서 탈출하려는 미아처럼 이곳저곳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심코 하늘을 쳐다보았다.
저녁놀이 지고 있는 작은 산 넘어 연기가 높이 떠오르고 있었다.
연기? 무슨 연기가 저렇게 크게 나는 거지?
축제라도 하는 것인가?
일단 가서 하룻밤만 묵게 해 달라고 해야겠다.
그런데 정말 멀다....
아 언제가지?
남는 건 몸밖에 없으니....
나는 걷기 시작했다.
내 17년 인생 중 남는 건 몸과 이 목숨뿐
이게 우리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제산
우리의 삶은 언제나 똑같아
언제나 일하고
언제나 바치고
언제나 빼앗기지
그게 우리의 삶
지겨울 정도로 무한히 반복되는 삶속의 나는 무었을 바라고 있을까?
평등? 기회? 자유?
이런 건 사치일 뿐이지 제아무리 이런 것을 보장한다고 해봐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면 있으나 만한 것 일뿐이지....
나는 이것저것을 생각 하다가 작은 산에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
....
....
....
....
....
....
아비규환의 수라도를 연산시키는 죽음의 축제였다.
그리고
“아...아, 아, 아,”
더 이상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뤄 말할 수 없는 감각이 전신을 휩쓴다.
믿을 수 없다....
말도 안 돼....
이건...꿈이야....
꿈이 이겠지?....
그래...이건 꿈이야....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어.
나는 애써 부정한다.
하지만 나는 보고 있었다.
이 피와 죽음의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철의 갑옷을 입고
은빛 검을 들어
피를 뿌리며
날카로운 창을 들고
꿰뚫며
높이 쳐든 망치로
내리쳐 머리를 부수고
휘두르는 도끼로
몸을 찢으며....
어째서....어째서....
웃을 수 있는 거냐.
어째서…….어째냐....
왜!
왜!!!!!
왜! 기사들이 사라들을 죽이는 거냐!!!!
어이가 없었다. 아니 어이가 없다 못해 산산이 부서져 내린 듯
방금 전 죽을 고비를 넘긴 내 몸은 그대로 풀려버렸다.
털썩
얼마나 멍해있었을까?
마을전채를 활활 태우던 불길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생각이 나의 뇌리에 꽂혔다.
우리 마을!!
풀린 다리를 억지로 일으켰다.
어서, 어서가자
우리 마을 만은 지켜야 돼!!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이곳이 어딘지 모른다.
철문이 있는 곳은 동굴이다.
계곡과 자연동굴을 연결시킨 것이겠지....
계곡도 안 보이는 상태에선 돌아 가봤자
별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을 거고....
나는 깊게 한숨만을 내숼뿐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어찌해야할까…….
이미 해는 지평선을 넘어섰고 황혼을 남겨놨지....
답이 안 나온다.
그 순간 내 뒤에서 커다란 손이 나를 감싼다.
“읍! 읍! 읍!”
그리고 거친 목소리가 나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다.
“꼬마야! 가만히 있어! 난 너를 해치지 않아!”
누가 속을 줄 알아!
내가 더욱 바동거리자 거칠고 두툼한 손은
나를 더욱 세게 조여 왔다.
“잠시만! 잠시만 풀어 줄 태니 내말을 들어봐”
물론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손을 푸는 즉시 뛰어나가던 도중
험난한 일을 격고 지쳐 쳐버렸지만 기운만큼은 생생한
거친 목소리가 나를 멈추게 하였다.
“기사들이 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지 알고 싶지 않나?”
멈칫
“머요?”
“왜 기사들이 사람들을 죽이는지 말이야”
“…….”
“일단 저놈들에게 들키지 않게 숨차고”
“…….”
나는 고계를 끄덕였다.
“어서 가자고”
남자와 나는 서서히 숲속으로 사라졌다.